
니체는 가장 위험한 사상가, 또는 전복의 철학자라고 불린다. 니체 스스로가 "나는 망치를 들고 기존의 모든 절대적 가치들을 부숴버리겠다"라고 말했다. 니체는 프로이센 작센지방의 뢰켄에서 태어났다. 5세에 목사인 아버지를 여의고, 할머지 집으로 이사했다. 그곳에서 니체는 할머니, 어머니, 두 고모, 그리고 여동생 및 하인들, 그러니까 모든 여성들 속에 둘러싸여 어린 시절을 보냈다. 천재였던 그는 24세에 학위도 없이 스위스 바젤대학교의 교수가 되었지만, 건강이 악화되어 34세에 교수직을 버리고 여행과 요양을 반복하며 저술활동을 하였다. 어느 날, 이탈리아 토리노 광장에서 채찍에 맞고 있는 말을 보고 뛰어가 끌어안으며 그대로 의식을 잃었다. 그 이후 10년을 더 살았지만 의식이 돌아온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하니 실로 기구하기 그지없는 인생이다. 그의 철학 또한 그의 인생처럼 이해하기 어려우면서도 아주 매력적이다. 사실, 다독다독 독서모임에서 니체의 책을 읽게 될 줄은 몰랐다. 그것도 니체의 사상을 이해해야 제대로 읽힌다는 그의 대표작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읽고 나누게 될 줄 어찌 알았겠는가? 그러나 우리네 삶은 그러한 우연의 겹침에 의해 형성되듯이, 나에게 니체와 그의 저서는 불편하면서도 많은 것을 다르게 생각해보게 하는 도전이 되었다. 그렇게 우연 안에 필연이 있었다.
니체 사상 5가지는 다음과 같다: 허무주의(신의 죽음), 노예도덕과 주인도덕, 힘에의 의지, 위버멘쉬(초인), 그리고 영원회귀. 니체는 기독교 하나님의 죽음을 선포했다. 신을 인간이 죽였다. 니체는 <즐거운 학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떻게 우리가 바닷물을 다 마셔버릴 수 있었단 말인가? 누가 우리에게 지평선 전체를 닦아버릴 수 있는 스펀지를 주었단 말인가?" 신을 이야기하던 사회에서 니체는 이제 신담론이 아니라 인간에 대해 말하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신의 죽음을 선포했다. 이 신의 죽음은 필연적으로 허무주의를 동반한다. 기댈 곳이 없는 인간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허무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2. 니체는 기독교로 인하여 주인도덕과 노예도덕에서 전복이 일어났다고 주장한다. 원한감정을 가진 노예가 주인의 특성을 악으로 규정하고 그 반대편에 있는 자신을 선으로 규정하였다. 그리하여 좋음과 나쁨이 선과 악이 되었다. 그 일련의 과정을 고대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추적하며 써 내려간 저서가 <도덕의 계보학>이다. 어떻게 주인과 노예에서의 전복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것을 니체는 힘에의 의지로 설명한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힘에의 의지(Will to Power)를 가지고 있다. 자신을 유지하고 확장하고 정복하고 성장하고 상승하기를 원하는 힘에의 의지로 인하여 전복이 가능하다. 그래서 니체에게 진정한 적은 진정한 벗이 된다. 이러한 힘에의 의지를 지혜롭게 사용하는 자, 자신을 극복하는 자, 자유정신을 가지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창조하는 자가 바로 위버멘쉬이다. 또한 위버멘쉬는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는 자(Amor Fati)이다. 아픔이고 고통이며 끔찍한 것이라 할지라도. "몇 번이라도 좋다. 이 끔찍한 삶이여 다시 한 번!" 그래서 이 삶이 영원히 반복되어도 좋다며 영원회귀를 긍정하는 것이다.
정신은 한 때 낙타였다. 낙타는 묵묵히 무거운 짐을 진다. '나는 마땅히 해야만 한다'는 복종과 고행을 반복하는 노예정신이다. 낙타 정신이 권위의 정당성에 의심을 품기 시작할 때 정신은 사자가 된다. '나는 하고자 한다'는 정신은 전통의 가치와 강제된 것을 거부한다. 새로운 가치 부재에 허무함을 느낄 때 정신은 비로소 어린아이가 된다. "아이는 순결이요, 망각이며 새 출발이고 유희이며 스스로 돌아가는 바퀴요, 최초의 운동이며 신성한 긍정이다.” 아이는 자신의 세계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지금 여기”의 삶을 긍정하는 진정한 자유정신, 즉 위버멘쉬이다.
니체는 대립적인 이분법을 거절한다. 적이 친구가 되고, 친구가 적이 된다.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되며, 가벼움이 무거움이 되고, 무거움이 가벼움이 된다. 위가 아래가 되고, 아래가 위가 되며, 우연이 필연이 되고, 필연이 우연이 된다. 수동이 능동이 되고, 능동이 수동이 된다.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시선과 해석의 관점에 따라 달라질 뿐이다. 절대적인 것이란 없다. "중심은 어디에나 있다. 영원의 오솔길은 굽어 있다." 니체 당시 운동의 원리는 원인과 결과인 인과율의 법칙에 따른 직선운동이었다. 그러나 니체는 시간상 운동의 동시성, 공간상 순환하는 원운동을 설명한 것이다. 하나가 다른 하나에 선행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함께 작용하는 원환운동이다. 그래서 아래 그림 뫼비우스의 띠처럼 안이 밖이고, 밖이 안이된다. 어디나 시작이 되고, 끝이 된다. 그러니까 시작이 끝이 되고 끝이 시작이 되는 것이다. 즉 기존의 대립이 니체에게는 더이상 상이한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것의 다른 표현과도 같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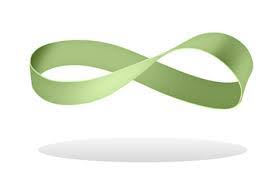
여기서 질문 하나를 해보자. 왜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라는 이름을 차용했을까? 차라투스트라는 조로아스터교의 창시자인 조로아스터의 헬라 이름이다. 조로아스터교는 선과 악을 이분한 최초의 종교였으며, 니체는 그를 소환하여 선악의 자명성을 깨트리고 도덕성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조건을 배제할 수 없는 끊임없는 해석의 과정임을 역설한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구조의 의해 영향을 받는 어찌 보면 자유롭지 못한 자이다. 니체는 나를 가두고 있는 그 틀을 인식하고, 그 구조를 벗어나 생각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그것은 구조안에서 안일하게 머물고자 하는 나를 극복하는 과정이며, 스스로의 가치를 창조해야 하는 좁은 길이다. 사실, 나를 얽매이고 있는 틀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불가능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가능을 향한 도전, 형성된 틀을 부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며, 창조된 것을 또 다시 부수고 또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그 모든 과정 안에 니체는 인간이라는 주체를 설정한다.
라캉이 말한 주체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며, 타자의 욕망을 인식하고 깨부수고 나서 새롭게 만드는 나의 욕망 또한 결국 다른 형태의 타자의 욕망 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자의 욕망에 갇혀있음을 깨닫고, 낡은 서판을 부수는 과정, 그리고 새로운 서판을 기록하는 즉 나의 욕망을 만드는 (결국 또 다른 타자의 욕망이라 할지라도) 반복되는 과정 속에 있는 욕망하는 인간이 바로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윤리적인 인간일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니체의 가치를 창조하는 주체와 라캉의 자신의 욕망을 창조하는 주체는 동일한 맥락 안에 있는 주체이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기원후 4세기의 신학자 그레고리 니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윤리 또한 동일한 패턴을 보인다.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고 인식하는 모든 것은 언어를 통한 학습의 결과이다. 그리하여 그레고리는 부정 신학, 즉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다는 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알아감에 접근한다. 내가 가두어 두었던 신에 대한 관념을 부수고, 그곳에 새롭게 드러난 개념적 신을 만나기를 반복한다. 그러나 핵심은 긍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에, 깨뜨림에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이성 너머(beyond)에 존재하며, 우리의 이성이 도달할 수 없는 무한자(infinity)이기 때문이다 (라캉의 실재계).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신비한 어둠으로의 초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체나 라캉처럼, 불가능에 대한 접근을 반복하는 것을 나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윤리적 자세라고 생각한다.
윤리적 자세,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니체는 모순과 고통과 아픔까지도 끌어안고 나의 삶을 긍정하고 이러한 삶이 다시 찾아오기를 갈망하며, 즉 불가능성 안에서의 가능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것을 추천한다. 이는 무의미한 세상에서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한 몸부림일 수도 있겠지만, 단 한 번뿐인 삶을 타자의 삶이 아닌 불가능하지만 그 한계 안에서의 가능성으로서 나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의 표현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잊지 말자. 나의 욕망을 인정하려면 너의 욕망도 인정해 주어야 한다. 타인도 나처럼 욕망하는 자이다.
니체 공부는 이제 시작이다.
삶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
2020년 5월
'독서 감상문 2020'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올더스 헉슬리 <멋진 신세계> (0) | 2020.07.14 |
|---|---|
| 사무엘 베케트 <고도를 기다리며> (1) | 2020.07.14 |
| 밀란 쿤데라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0) | 2020.07.14 |
| 알베르 카뮈 <페스트> (0) | 2020.07.14 |
| 하인리히 뵐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 (0) | 2020.07.14 |



